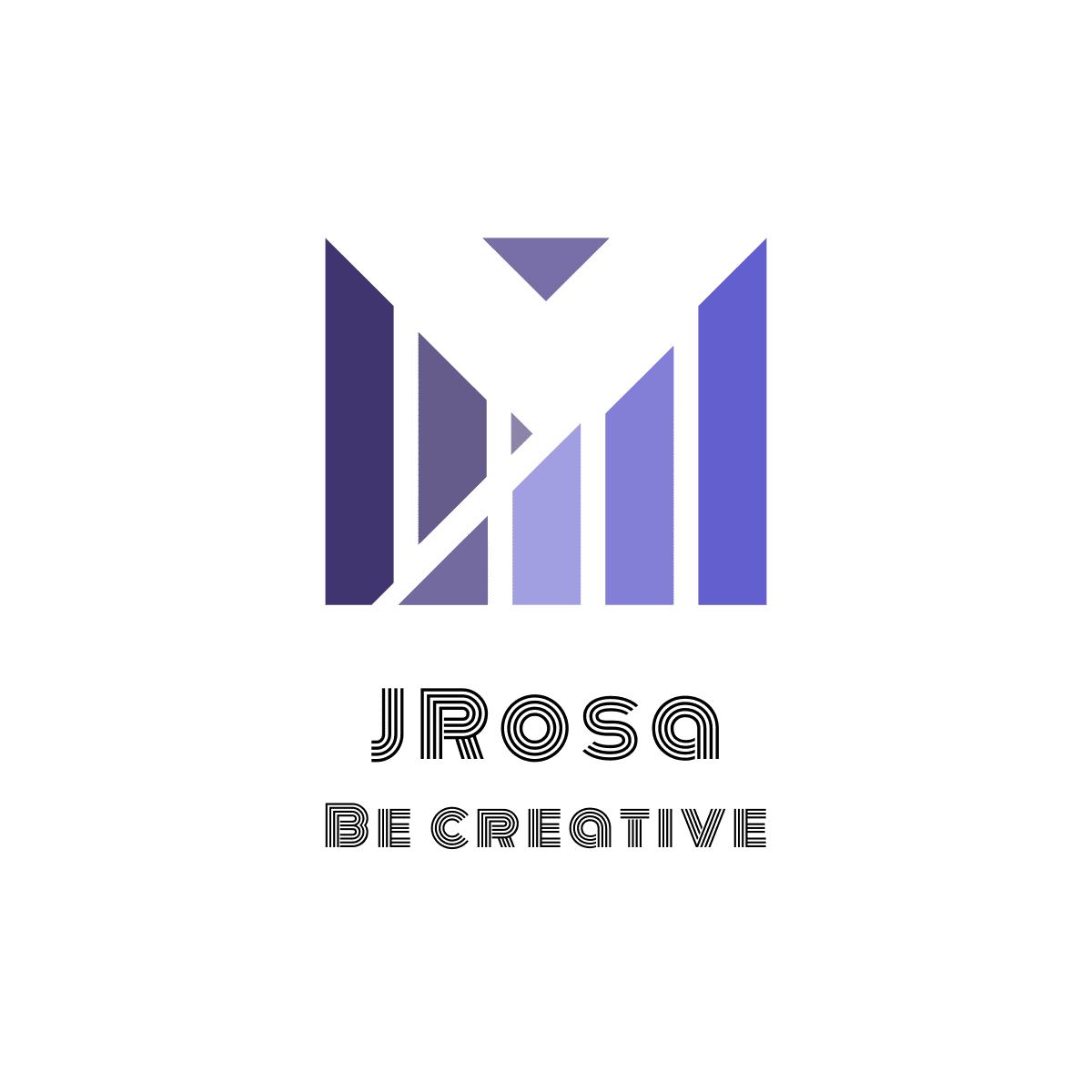-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지 않을 것같은 두 개의 선이 있다. 어쩌다 한번 안부만 확인하고 마는 배다른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게된 신기정 그리고 사채업자의 독촉에 못이겨 도시가스 호스를 끊어 자살한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린 윤세오. 이 둘은 모두 가족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신기정은 그 기점으로 동생의 삶을 역으로 추적해나가고, 윤세오는 아버지를 궁지로 몰고간 그 사채업자에 대한 물리적 복수를 계획한다는 점에서 뻗어나가는 선의 방향이 달랐다.
두 선의 접점은 이야기의 끝에 가까워지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데, 죽은 동생의 통화기록에 찍힌 번호 중 하나를 찾아간 곳에 윤세오가 있었고, 신기정은 윤세오를 만나 동생을 알고 지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 둘의 접점은 어떤 깊이도 없이 그저 스치는 정도이지만 신기정은 윤세오와의 대화를 통해 동생에 대한 애도를 시작할 수 있게되고, 꿈에 그리던 복수를 목전에 둔 윤세오는 신기정의 모습에서 복수 이후 자신에게 다가올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된다.
사실 편혜영 작가의 장편소설은 처음 읽어봤다. 다른 유명한 소설 중 하나를 읽어보려다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은, 생소한 제목의 책을 골랐다.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재미도 딱히. 심지어 복수극은 싱겁다 못해 뭐 어떻게 끝난건지도 모르게 흐지부지된다. 애초에 복수를 말하려는 책이 아닌 건 알았지만, 뭔가 윤세오의 이야기도 이 지점 이후가 더 궁금한 느낌으로 남았다고 해야할지. 오히려 신기정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시원하지 못한 기분으로 책을 덮고 나서 뒷표지에 써있는 권희철 평론가의 추천사를 읽었는데, 되려 이 추천사이자 짤막한 평론이 더 뇌리에 깊게 박혀서 아래에 이 글을 옮겨 적는다.
-
어쨌거나 삶은 계속된다. 무슨 짓을 어떻게 하더라도 심지어 아무 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단지 살아지는 삶에서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이 살므이 난처한 점이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정당화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그 의무감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런 것처럼, 약점이야말로 우리의 힘이다. 주어진 의무를 어쩔 수 없이 떠맡을 때 삶은 살아갈 만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화된 삶은 애초에는 예상치 못했던 모습으로만 주어진다. 그것을 삶의 비의悲意라고 해야 할지 비의秘意라고 해야 할지. 그런 비의가 『선의 법칙』에는 있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해버린 삶의 한 부분을 떠맡으려 분투하다가 의외의 변화의 기미에 직면하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한자리에 멈춰 있는 자신의 삶을 이리저리 끌고 가며 주저흔躊躇痕을 남기는 것. 『선의 법칙』을 읽는 일은 삶의 비의를 음미하는 일과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이다. - 권희철 (문학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
반응형'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멋진 사용자 경험을 위한 정보 아키텍처 및 내비게이션 디자인의 마법 (0) 2023.06.25 사용자 페르소나와 사용자 프로필의 힘 이용하기: 대상과 더 깊은 연결 고리 만들기 (0) 2023.06.24 UX 디자인의 사용자 연구 (0) 2023.06.19 [임신준비] 보건소 예비부부 건강검진 (0) 2018.09.01 [Travel] 실롬 타이 쿠킹 스쿨 후기 (Silom Thai Cooking School) (0) 2018.08.23
유월의 로사
좋은 습관으로 채워지는 일상.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지만 안 하는 일 찾아서 하기!